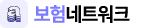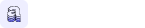인수격의 용신과 정관
인수격은 한 가지만 있다. 그 중요한 원리는 항상 식상이 용신이다. 이 글에서는 인수격과 재관, 그리고 식상격을 통해 인수와 식상의 역할을 탐구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인수격과 재관
원리학당에서는 인수격과 재관이 없는 식상격을 양육격으로 보면서 재관을 쓰는 부귀격과 차별을 둔다. 인수격과 재관이 없는 식상격은 ‘먹었으면 싸라.’ 또는 ‘싸기 위해서 먹어라.’에 해당되는 격국이다. 인수가 공부라면 식상은 공부한 것을 풀어먹는 것이다. 식상이 풀어먹는 것이라면 인수는 풀어먹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해서 인수격의 용신은 식상이고, 재관이 없는 식상격의 용신은 식상 자체이다.
인수격과 印食인식 양육격
양육격의 왕쇠 판정법은 인수의 수용과 식상의 표현으로 구조를 비교한다. 관살과 인수가 한 구조로 수용 능력이고, 식상과 재화가 한 구조로 표현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인수의 역할은 식상의 설기나 식상생재를 잘할 수 있도록 일주를 도와주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인수격은 일종의 삼상격이다.
정관과 인수
인수격에서 정관도 중요하지만, 인수격은 관살을 쓰고자 해도 인수가 있어서 급신이라 관살을 쓸 수가 없다. 또한, 인수가 식상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해 주므로 중요한 정관이 다치지 않으니 식상을 마음 놓고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정관의 중요성
정관이 중요한 존재이므로 어떤 격국에서든 정관을 우선시하여 용신으로 잡는 것이 일반론이다. 인수격에서도 정관이 투간했을 때 정관을 중시하여야 한다. 인수격이 용신 정관을 설기시켜 일주를 생조하면서 정관이 일주를 다스릴 수 없도록 하는 병병인 인수를 쳐주면서 정관을 생조해주는 재화를 희신으로 쓴다.
재화와 인수
재화와 인수는 정편으로 나누지 않고 동일한 격으로 논의된다. 인수의 격국은 다양하며, 신강한 인수가 용신이면 간단하게 생각해도 된다. 그러나 정관이 다치면 안 된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식상과 재화
식상이 그 자체로 용신이면 좋지만, 식상이 생재하면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식상이 생재하는 형국이 아니고 재화가 호식하는 형국이거나 왕성한 식상을 인수가 쳐줄 때는 귀하다.
결론
인수격은 식상의 용신과 정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격으로, 정관이 다치면 안 된다. 식상이 그 자체로 용신이면 귀하게 여겨지며, 재화가 호식하는 형국이거나 인수가 식상을 쳐줄 때 또한 귀하다. 이를 통해 인수격의 복잡한 세계를 조망해보았다.
관련 글 모아보기 ↓
금여록(金輿祿) 사주 특징 – 결혼운과 외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